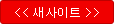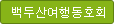밭머리 먼 밭골에서 허리 굽혀
이삭을 줏다가
6월에 뜨는 꽃 누가 진달래라
할 것인고
손끝에 닿는 하늘
그 물의 원두에서도
우라고 했다
비가 내려 한결 축축한 날
고풍스런 구리거울에도 례외 없이
구름은 어려있었다
어디에도 실은 남아있지 않으리라
믿었던.
자작나무숲에서
네가 빨갈 때 나는 까맣고 네가 까말 때
나는 빨갛다
덮인 날 검은 흙에 해살은 살이 되여
천년을 넘어온 그리움의 바람이런가
수렁길에 설이 오른 소똥 식지 않은
물 남의 말소리
멀어지지 않고 가까워지지 않는 사의에는
둥지를 튼 음악이 초원으로 여리다
어둠에 맞먹는 그늘 밑을 굴러가는 살 촘촘한
저 바퀴.
습 지
밀려온 것이 자작나무숲을
짠하게 한다
낮은 곳을 선택했다가 이렇게
하늘을 갔고 구름을 갔고
별을 숨기게 된 것이다
머문다는 것은 아름다운 풍경을
만들 수밖에 없는
저지대를 습하게 만든 것은
돌아갈 수 없는 물이다
새들의 지저귐에도 절반쯤
슬픔을 얹어준.
숭선 폭포
내가 아니라 너에 의해
얻어낸 멋
누가 시대를 택할 수
있겠냐만
운명은 너로 하여 달라져
있었다
미울 수 없는 농토 30리
구실이라면 어떠랴
너에게로 간다는 것 타고난
복이여라
그리움 천리를 허물고
두만강
둘이 하나로 되는 일은
숨기기 어려운 그림이였다.
상천벌
거북등 각골문 임금의 옥새
품도 품이려니와 물이 먼저니
올라선 두만강 꿈이라 하라
모내기 풍경은 지우지 못한
군함산 손톱눈에 흙이라 할가
얻어지는 것이 잃은 것을 덮을 수 있다면
가을에는 눈물 없이 마주설 수 있을지
그 뜰에 물이 들면 명경이
따로 없나니.